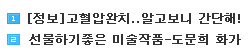2014. 3. 15. 16:08ㆍ경영과 경제

|
|
1977~78년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미국 프린스턴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때 두 사람은 프린스턴대로 온 젊은 경제학자와 친해졌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너지(Nudge)’의 저자이자 현재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인 리처드 탈러였다. 탈러는 경제학자였지만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 양식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 세 사람은 금방 친구가 됐고 그들의 교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1979년 전망이론을 발표한 직후인 1980년 탈러 교수 또한 ‘소비자 선택의 긍정이론(Toward a positive theory of consumer choice)’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너지 이론의 토대를 닦는다. 카너먼 교수는 후에 탈러의 이 논문을 “행동경제학의 시초”라고 극찬했다. 확증 편향과 휴리스틱 카너먼이 트버스키와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는 인간의 의사결정 편향(bias)이다. 심리학엔 ‘아전인수(我田引水)’와 비슷한 개념인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사실로 믿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2년 미군 사망자들을 조사한 결과 자살한 군인 수가 349명으로 교전 중 전사한 313명보다 많다고 밝혔다. 일반인으로 확대해봐도 타살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렇지만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절대 다수가 ‘자살보다 타살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답한다. 왜 이런 오류가 생길까. 뉴스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참상, 강력 범죄로 인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훨씬 많이 보도되기 때문이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토머스라는 소년이 있다. 어른이 된 토머스가 도서관 사서와 농부 중 어떤 직업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까. 사람들은 토머스의 성격을 감안해 대부분 사서라는 답변을 한다. 하지만 토머스는 농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의 농부 수는 사서보다 20배나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엄연히 객관적 사실(fact)이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관습 등을 통해 판단을 내린다. 카너먼은 이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휴리스틱(heuristic)’이라고 일컫는다.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휴리스틱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주는 근거다. 휴리스틱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기준점과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을 살펴보자. 기준점과 조정은 소비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수치로 모종의 기준선을 설정한 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시가격이 8000원인 인삼 드링크를 보고 대다수 소비자는 다른 음료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희망소비자가격이 1만 원인데 8000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 이 드링크가 싸다고 여긴다.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최근 발생한 사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요즘 스마트폰에 관한 뉴스가 몇 초마다 쏟아져 나오다보니 통화와 문자 기능만 사용하는 노년층 소비자까지 피처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중국산 식품의 유해성 논란이 일면 국산 친환경 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소비자가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 Heuristic)’은 어떤 집합에 속하는 사상이 그 집합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뜻에서 대표한다고 간주해 빈도와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후광 효과(halo effect)다. 원조 음식점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북적대지만 바로 옆의 모방 음식점은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릴 때가 많다. 소비자가 대표성 휴리스틱에 따라 음식점을 고르는 까닭이다.
손실 회피(Loss aversion) 어떤 사람이 당장 얻을 수 있는 1000만 원과 손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이 90%인 20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절대 다수가 안전하게 1000만 원을 얻겠다고 대답한다. 바로 손에 쥘 수 있는 1000만 원의 가치가 2000만 원을 얻을 90%의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확률 90%인 2000만 원이 훨씬 이익인데도 말이다. 인간은 이득을 얻고픈 욕구보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은 2000만 원을 잃을 10%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확실한 1000만 원을 향해 손을 내민다. 이처럼 인간은 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이 동일한 가치인데도 이익을 얻기 위한 위험보다 현재 보유한 것의 손실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익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효용함수가 각각 다르다는 의미다. 이익을 봤을 때는 효용함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손실을 보면 이 함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손실 회피(Loss Aversion)’라고 한다. 이 손실 회피 심리에 따라 인간은 이기는 것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는 것을 통해 잃는 손실을 더 두려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실이 두려워 내린 인간의 많은 선택이 종종 더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내린 선택이 스스로의 족쇄로 작용해 더 큰 손실을 낳는다는 뜻이다. |
'경영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소득불평등, 2019년 OECD국가 중 1위 된다 (0) | 2014.09.14 |
|---|---|
| 행동주의 경제학 창시자 / 대니얼 카너먼 1 (0) | 2014.03.15 |
| ‘행동경제학’ 창시자 / 대니얼 카너먼3 (0) | 2014.03.15 |
| 구두쇠 경영/ 이케아 창업주 (0) | 2014.03.15 |
| 하버드 두 마이클 (0) | 201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