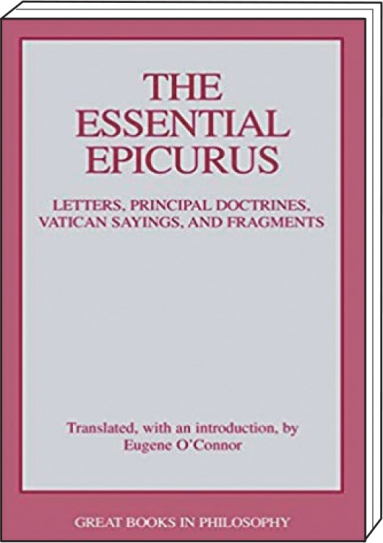|
1992년 이탈리아에서 아주 먼 옛날에 나온 책이 느닷없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기원전 341~270)의 『저작집』이다. 결혼식·생일 선물뿐 아니라 상(喪)을 당한 친지들을 위로하는 용도로도 주목받았다. 세계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이탈리아에서 『저작집』이 폭발적인 반응을 누린 것은 아이러니다. 『저작집』은 ‘신(神)을 배제한’ 행복의 비결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는 ‘정의란 무엇인가’만큼이나 피하기 힘든 질문이다. 이 질문에 에피쿠로스만큼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은 역사상 없다. 『저작집』은 영문판 『The Essential Epicurus: Letters, Principal Doctrines, Vatican Sayings, and Fragments』 기준으로 101페이지밖에 안되는 분량이다. 에피쿠로스의 글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다. 사실상 그의 전집(全集)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집』은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 ‘퓌토클레스에게 보내는 편지’,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주요 신조’, ‘바티칸 소장 에피쿠로스 어록’으로 구성됐다.
‘행복’을 자신 있게 정의한 에피쿠로스
|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다. 모든 쾌락은 같다. 하지만 쾌락은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을 이성으로 제압함으로써 달성된다.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아타락시아(ataraxia), 즉 마음의 평정부동(平靜不動) 상태가 된다. 에피쿠로스는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흔들리지 않게 되면 인간들 사이에서 신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욕망 없이 살 수 없다. 에피쿠로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성취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취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What will happen to me if what I long for is accomplished? What will happen if it is not accomplished?)”
한데 아타락시아의 적은 탐욕이다. 탐욕은 병이다. 특히 식탐(食貪)이나 색탐(色貪)은 금물이다.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과음·과식, 음주가무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때만 좋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파 후회하게 된다. 권력도 돈도 그때뿐이다. 오래가는 쾌락을 주지 못한다. 돈이나 권력 또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깬다.
삶을 바꾸려면 욕망이 소박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조금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는다(He who is not satisfied with a little, is satisfied with nothing.)”라고 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제자들의 식단은 간단했다. 보리빵, 치즈, 물, 물로 희석한 포도주를 먹고 살았다. 에피쿠로스는 치즈 한 조각도 진수성찬만큼 쾌락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욕망의 종류가 바뀌어야 한다. 우정, 자유, 수양, 철학적 성찰의 시간 같은 것들은 추구할 만한 쾌락이다. 돈, 권력, 명예 같은 ‘헛된 욕구’들과 달리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라(Live your life without attracting attention.)”고 했다. 익명(匿名)으로 사는 게 최고다. 정치에 가담하는 것에도 부정적이었다.
쾌락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막는 최고의 수단은 철학이다. 철학은 마음의 약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몸에서 병을 쫓아내지 못하는 의술이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영혼의 병을 쫓아내지 못하는 철학도 쓸모가 없다.”
에피쿠로스는 철학을 이렇게 예찬했다. “진정한 가치는 연극, 목욕, 향수나 연고가 아니라 철학으로 생성된다(Real value is not generated by theaters, and baths, perfumes or ointments, but by philosophy.)”
그렇다면 철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죽음의 철학’이 핵심이다. 당시 일부 철학자들은 모든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는 타인의 죽음에는 슬퍼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에는 쓸데없는 공포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회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러니 20년 먼저 또는 늦게 태어났다고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일찍 세상을 뜨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선과 악은 감각에 달렸다. 감각이 없는 게 죽음이다.”
고대 대표적 유물론자로 꼽히는 저자
|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신(神)들이 있기는 있다. 창조주는 없지만, 신들은 존재한다(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조주가 있다고 봤다. 특히 플라톤은 조물주가 이데아에 맞춰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주의 탄생과 유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신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상선벌악(賞善罰惡)에 관심이 없다. 내세가 없기에 사후 심판도 없다. 몸뿐 아니라 영혼도 원자로 구성됐다. 영혼도 물질이기에 죽으면 사라진다. 다시 태어나거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아무것도 상실하는 게 없다. 죽은 다음에는 뭔가를 바랄 몸이나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면 에피쿠로스주의는 ‘영원한 죽음을 약속’한다고 할까?
데모크리토스(기원전 460?~370?)와 더불어 에피쿠로스는 고대의 대표적인 유물론자다. 에피쿠로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으며 우주는 물질(원자)과 공간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교조인 유물론자 카를 마르크스(1818~1883)의 박사학위 논문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에 대하여』(1841)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이 그 어떤 사상가의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독학으로 사상 체계를 이뤘다고 주장했지만, 원자론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음(undisturbedness)’의 개념도 데모크리토스가 원조다.
우주에는 무수한 세상이 있으며, 신들은 세상과 세상 사이에 존재한다. 신들은 지극한 평온함 속에서 존재한다. 사람들과 달리 모든 욕망이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쾌락주의의 이상이다. 그들은 인간사에 간섭할 여유가 없다. 자신들의 행복을 음미하고 관조하느라 바쁘다. 만약 그들이 인간들의 기도에 응답하거나 인간들의 악행에 분노한다면 그들의 평온함이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신들에게 청하는 것은 쓸데없다(It is useless to ask for what one is capable of obtaining for oneself.)”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섭리(攝理·providence), 즉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원자들이다. 천둥·번개·지진 같은 것들도 원자 소관이지 신들의 분노와 무관하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관점과 달리 에피쿠로스주의는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톨릭 신앙과 에피쿠로스주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믿음이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수용한 에피쿠로스주의에 따르면 원자가 무작위로 방향을 틀며 끊임없이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그 결과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그리스도교 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철학은 교회로부터 ‘사상적 탄압’을 받았다. 단테(1265~1321)의 『신곡』은 에피쿠로스와 제자들이 지옥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개에 중요한 한 축을 이뤘던 그가 부활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다.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대중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 on the Nature of Things)』라는 시집이 에피쿠로스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책 300여 권 집필, 일부분만 전해져
고대 그리스의 오랜 철학시(哲學詩) 전통에 따라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지은 이는 로마 사람 루크레티우스(기원전 99년께~55년께)다. 이 책은 그가 남긴 유일한 작품이다. 스페인 출신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1863~1952)는 단테·괴테와 더불어 루크레티우스를 ‘3대 철학 시인’으로 꼽았다. 아인슈타인은 1923년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독일어판 서문을 이렇게 적었다. “시대정신에 완전히 흠뻑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 루크레티우스의 시는 마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로마제국 멸망 후 잊힌 작품이었다. 1417년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됐다. 하버드대 그린블랫 교수(영문학)에 따르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르네상스 시대 유럽을 뒤흔들었다. 계몽주의의 틀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에피쿠로스주의자다”라고 말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라틴어 판본 5종과 영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 번역본을 소장했다. 그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주창한 ‘행복추구권’의 뿌리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도 제기됐다. ‘쾌락’을 ‘행복’으로 살짝 바꾼 것이다. 사실 쾌락주의에서는 쾌락이 곧 행복이다. 한편 몽테뉴(1533~1592)는 『수상록』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100회가량 인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신격화를 거부하는 사상은 이전의 신격화에서 벗어나자마자 새로운 신격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에피쿠로스를 ‘영웅’, ‘구원자’라고 불렀다. 루크레티우스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자연을 거의 신격화했다. 또 제자들은 “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를 풀어준 루크레티우스를 신격화했다. 이렇게 말이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현실의 발견자이십니다.”
17~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이신론(理神論)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세상일에 관여하거나 계시나 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인격적 주재자로서의 신은 부정했다. 창조주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신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피쿠로스주의와 이신론은 일맥상통한다. 불교와도 유사점이 발견된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의 이상은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에피쿠로스는 섹스와 결혼에 부정적이었으며 채식주의자였다.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사모스에서 태어나 아테네에서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는 교사였다. 기원전 306년 아테네에서 집을 한 채 사고 정원에 학원을 세웠다. 사람들이 호케포스(Ho Kepos, 정원이라는 뜻)라고 부르는 그의 학원은 여성과 노예도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연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등 책 300권(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만든)을 집필했지만 대부분 실전됐다. 『저작집』에 포함된 편지 3편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에 영향을 줬다는 설이 있다. 72세 때 전립선염으로 사망했다.